[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저/이시형 역 | 청아출판사 |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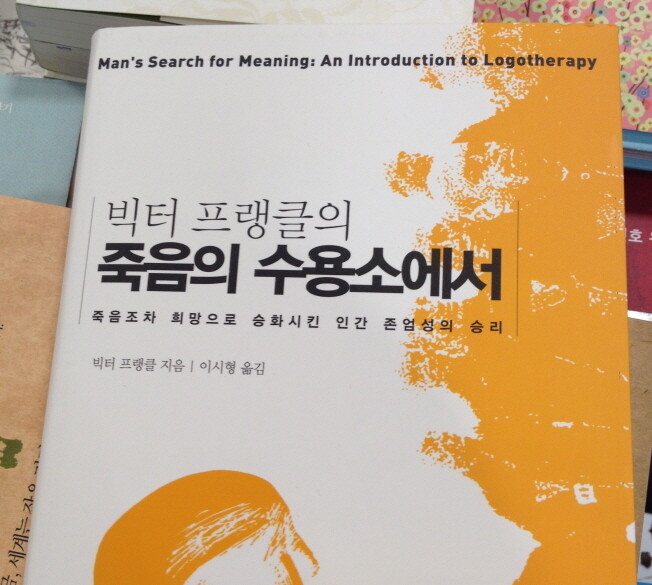
저자가 인용한 니체의 이 문장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에서 얻은 깨달음과 저자가 창안한 제 3의 심리치료 학파인 로고테라피(Logotherapy)의 기본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더욱 사람을 절망케하는 수용소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돼지'가 된다.
"감사하게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강제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다. ..프로이트의 말과는 달리 강제수용소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모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차이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람은 가면을 벗고, 돼지와 성자의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
아무리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똑같이 배고픔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결국 단 한가지의 목소리만 나타나게 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잘못이라고 반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상황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행동은 조건반사처럼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에 대해 항상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이다.
그러기에 어떤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들기도 하지만, 의연하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가스실을 등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사는가?","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무시로 떠오르는 궁금증이고, 철학이나 종교도 근본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많이 괴롭고 슬프고 어쩌다 가끔 기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가 칼이 되고 총이 되고 백린탄이 되어 두살짜리 아이를 태워죽이는 세상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수백명의 목숨이 생매장되는 과정을 실시간을 보면서, 과연 여전히 살아 있는 나는 왜 사는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세상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집단을 이룬 아득한 그 시절부터 이보다 더한 고통과 슬픔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다.
젊은 시절 잠깐 인생의 의미라는 막연한 명제를 떠올렸다가 잊어먹은 후, 사십년도 더 살아낸 이 나이에 다시 이 질문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저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삶의 의미가 무언지 찾기 위해 헤매지 말고, 무엇이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답을 구하라는 것이다.
삶에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묻지 말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삶에게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행동과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짊으로써만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이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흔히 신을 찾거나 욕하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한탄한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격한 고통이고 슬픔이고 울분이고 자책이 될 것이다.
당장 남쪽 바다에 생때같은 자식이 수장된 세월호 가족이 아픔을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기에 더욱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변이 아니라 태도와 실천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밖에 없다.
삶이 던지는 질문에 눈감고 귀막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그리하여 '성인'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돼지'가 되지는 말자.
허나, 이 글을 쓰는 내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국민을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한 국가가, 그럼에도 언죽번죽 아픔에 소금을 뿌리고 진상을 회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와 실천, 일상의 쳇바퀴를 돌리면서도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할 실천 사이의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든 건 독일이었지만, 가자 지구의 인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은 그 큰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이다.
어쩌면 이 책은 이제 팔레스타인 인민들에게 바쳐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삶은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고, 이 지옥보다 더한 고통에서 취해야 할 태도와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의 첫 경영어 수업 - ‘신입에서 CEO까지' 공통의 언어로 말하기 (0) | 2020.07.24 |
|---|---|
| 자치적인 기업은 가능하다 (0) | 2014.09.02 |
|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가 아니다 (0) | 2014.07.09 |
| 인간 존중의 신을 만나다 (0) | 2014.07.04 |
| 중소기업 경영, 실패하지 않는 법 (0) | 2014.07.03 |


